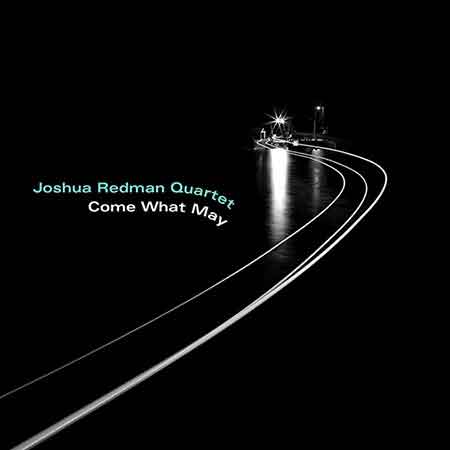지난 십여 년간 조슈아 레드맨은 참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다. 피아노 없는 트리오 편성으로 소니 롤린스의 시대를 추억하거나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함께 서정미를 한껏 발산하거나 쿼텟 편성으로 아버지 듀이 레드맨을 추억하거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닌 배드 플러스와 만나거나 브래드 멜다우와 듀오로 오밀조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앨범마다 변화를 거듭했다. 이 시도들은 모두 설득력 있었다. 어떠한 편성이건 어떠한 스타일이건 누구와 함께 하건 그는 자신의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주제를 이상적으로 구현했다.
그에 비한다면 이번 앨범은 다소 온건하다 할 수 있다. 예의 뜨거운 포스트 밥 성향의 연주 그 이상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앨범이 별로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내가 기다려 왔던 조슈아 레드맨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그것은 이번 앨범에 참여한 연주자들의 친숙한 면모 때문이다. 피아노의 애런 골드버그, 베이스의 루벤 로저스, 드럼의 그래고리 허친슨이 함께 했는데 이들은 모두 조슈아 레드맨의 오랜 친구들이다. 그러나 이 네 연주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01년도 앨범<Passage Of Time> 이후 18년 만이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저절로 색소폰 연주자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게 만든다. 실제 이 쿼텟은 조슈아 레드맨의 최고의 모습을 구현한 극강의 그룹이었다. 이 쿼텟이 남긴 2000년도 앨범 <Beyond>와 2001년도 앨범은 당대의 포스트 밥 사운드의 정점을 들려주었다. (물론 그 전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와 함께 한 앨범들도 좋았다. 그러나 편성의 지속성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18년 만에 모인 네 연주자의 연주는 어떨까? 역시 좋다. 그러나 18년 전에 비해 온화하다. 속도로 승부를 보는 대신 넉넉함을 기본으로 연주했기 때문이다. 넉넉하다고 해서 느슨하다는 것도 아니다. 네 연주자의 호흡은 오히려 지금이 한층 더 치밀하다. 이전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가는 것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같다.
그것이 조슈아 레드맨의 훌륭한 솔로 외에도 다른 세 악기에도 관심을 갖게 한다. “I’ll Go Mine”처럼 상대적으로 빠른 템포의 곡에서도 그렇지만 타이틀 곡처럼 느린 템포의 곡에서도 네 연주자의 어울림은 단순히 같은 길을 가는 수준 이상이다.
이러한 농밀함은 비록 18년만의 모임이지만 색소폰 연주자를 중심으로 세 연주자가 이런저런 편성으로 계속 함께 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여기에 나는 약 20년의 시간 동안 네 연주자 모두 나이를 먹었고 그 속에서 음악적으로 보다 완숙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더하고 싶다. 겸손한 어울림이 음악적으로 보다 높은 완성을 이끌어 낸 것이다.
새로움은 편성, 스타일의 변화 외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새로운 연주자를 만나는 것 외에 서로를 잘 아는 오랜 연주자들과의 어울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언컨대 음악 자체의 단단함, 정서적 안정성과 만족도에 있어서 조슈아 레드맨이 최근10여 년 사이에 발표한 앨범들 중 이 앨범이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