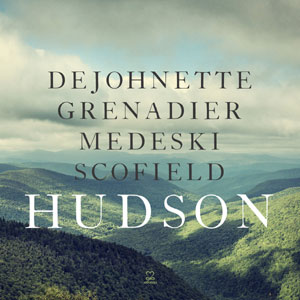존 스코필드(기타), 존 메데스키(오르간), 래리 그레나디에(베이스), 잭 드조넷(드럼)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라 평가 받으며 바삐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런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14년 우연히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함께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네 연주자 모두 허드슨 강 근처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계기로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존 스코필드(기타), 존 메데스키(오르간), 래리 그레나디에(베이스), 잭 드조넷(드럼)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라 평가 받으며 바삐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런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14년 우연히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함께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네 연주자 모두 허드슨 강 근처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계기로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슈퍼 밴드의 결성은 그 자체로 늘 흥미를 자극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쟁쟁한 선수들만으로 경기를 치르지만 정규 시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주지 않듯이 슈퍼 밴드들도 단순한 프로젝트에 머물곤 한다. 유명한 만큼 각각의 에고가 확실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이번 네 연주자의 만남은 그래도 실망시키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대단한 연주자들이 모인 만큼 대단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의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나온 것이다. 그냥 만나서 한번 즐겁게 연주해보자, 그래서 괜찮으면 세계 곳곳의 페스티벌을 누벼보자는 생각 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할까?
그래서일까? 수록 곡의 절반 가량이 조니 미첼, 지미 헨드릭스, 더 밴드, 밥 딜런 등의 60, 70년대 곡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그 곡들 모두 허드슨 강과 관련이 있기에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이들 곡들이 네 연주자들에게 공통의 추억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음악은 기타, 드럼 연주자에게는 청춘 시절의 음악, 베이스, 오르간 연주자에게는 유년 시절 동경했던 과거의 음악이었을 것이다.
그런 정서적 유대는 블루스, 소울, 록 등의 요소들이 자연스레 녹아 든 편안하고 넉넉한 음악을 가능하게 했다. 언제나처럼 펑키하고 블루지한 존 스코필드의 기타, 사이키델릭한 질감을 드러내는 존 메세스키의 오르간-피아노 연주도 멋지다-, 다양한 리듬에 든든한 부게감을 주는 래리 그레나디에의 베이스, 노장이라 믿기 어려운 잭 드조넷의 탄성 강한 드럼-게다가 노래도 했다-이 각자가 지닌 특급의 연주력을 드러내며 서로 기분 좋게 어울린다. 한편 지난 시대 히트 곡의 연주는 감상자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네 연주자의 합이 만들어 낸 음악의 뛰어남을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한편 존 스코필드나 잭 드조넷이 쓴 자작곡들 또한 상대적으로 긴장이 높을 때도 있지만 유명 곡들을 연주하며 보여준 편안한 어울림과 궤를 같이 한다. 그 가운데 “Hudson”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퓨전 재즈 시대를 연상시키고 “Song For World Forgiveness”에서 평화를 내세웠던 우드스톡 페스티벌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은 이번 앨범이 같은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넘어 공통의 음악적 추억을 지닌 네 연주자의 만남임을 생각하게 해준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앨범 또한 일회성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음악적으로 새로운 것도 없다. 하지만 함께 하는 즐거움을 감상자에게까지 전달한다는 것만큼은 슈퍼 밴드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