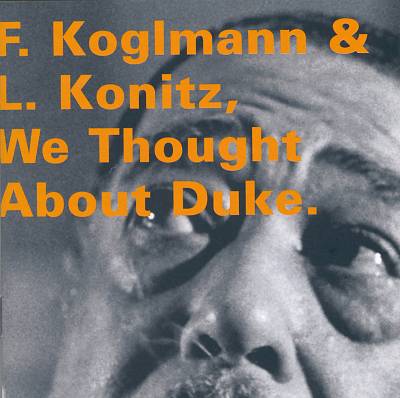듀크 엘링턴의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앨범은 감상자에게 던진다. 지금까지 듀크 엘링턴에 대한 셀 수 없는 헌정이 있어왔고 그 외에도 많은 연주자들이 듀크 엘링턴의 곡을 연주해 왔다. 그런 연주들에서 내가 느끼곤 했던 것은 테마의 작곡가로서의 듀크 엘링턴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연주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듀크 엘링턴의 스윙감이었다.
듀크 엘링턴의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앨범은 감상자에게 던진다. 지금까지 듀크 엘링턴에 대한 셀 수 없는 헌정이 있어왔고 그 외에도 많은 연주자들이 듀크 엘링턴의 곡을 연주해 왔다. 그런 연주들에서 내가 느끼곤 했던 것은 테마의 작곡가로서의 듀크 엘링턴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연주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듀크 엘링턴의 스윙감이었다.
그런데 이 앨범은 아주 예상 외다. 테마의 작곡자로서 듀크 엘링턴을 상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의 음악이 지닌 스윙감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는다. 옆의 자켓 사진처럼 약간은 진지한 듀크 엘링턴의 모습이 편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듀크 엘링턴의 이미지를 예상하며 이 앨범을 듣는 감상자는 약간의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앨범에는 두 개의 상이한 편성이 등장한다. 기타, 베이스, 트럼펫(플루겔혼), 색소폰(클라리넷)으로 이루어진 모노블루-푸른 색의 현대 미술가 이브 클라인을 연상시키는-퀄텟과 트럼펫(플루겔혼), 트롬본, 튜바로 구성된 파이프 트리오의 두 편성으로 듀크 엘링턴의 음악에 접근하는데 편성적인 면으로 보아도 일반적인 면을 벗어난다. 이런 편성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드럼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듬적인 측면은 베이스나 튜바로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듀크 엘링턴의 음악을 들으며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흔들림-스윙-은 거의 정지되어 버린다. 그리고 정지된 공간에는 쿨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듀크 엘링턴이 쿨하게 연주된다? 자못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화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듀크 엘링턴은 오케스트라를 위주로 편곡을 하지 않았다. 늘 함께 연주할 연주자를 위한 편곡을 했다. 어쩌면 듀크 엘링턴의 이러한 면 때문에 자니 허지스같은 듀크 엘링턴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연주자가 유명해 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 앨범에서 프란즈 코글만의 편곡은 리 코니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대 재즈를 과거의 사조로 설명하려는 것이 우매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리 코니츠를 중심으로 한 편곡이 이러한 쿨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번 ‘Lament For Javanette’를 들어보라. 약간의 풀어진 느낌과 함께 차가운 침묵의 공간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낭만적인 요소보다 묘한 슬픔이 느껴진다. 이것은 듀크 엘링턴의 음악이 지닌 새로운 모습의 발견이다.
한편 일반적인 듀크 엘링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간간히 일반적인 듀크 엘링턴의 웃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 특히 ‘Love Is In My Heart’나 ‘Dirge’같은 곡에서 잘 느껴진다. 이것은 솔로보다는 솔로를 감싸는 악기들의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드러나는데 비록 작은 편성이지만 오케스트라의 편성을 아주 잘 축소한 표현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듀크 엘링턴의 음악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밀고 당김이 살짝 느껴지는가 싶다가 이내 이 긴장은 느슨하게 풀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왜 프란즈 코글만은 듀크 엘링턴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을까?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듀크 엘링턴의 초상을 그리려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이미 많은 다른 연주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지 않은가? 오히려 프란즈 코글만은 듀크 엘링턴을 스윙의 시대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고 있다. 그 끄집어 냄을 자신의 색으로 칠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듀크 엘링턴의 음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모더니티를 강조하는 것으로 듀크 엘링턴을 스윙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 작곡가 듀크 엘링턴의 면보다는 예술가로서의 듀크 엘링턴의 면을 찾아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프란즈 코글만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듀크 엘링턴이라는 인간은 하나였을지 모르나 듀크 엘링턴의 음악은 스윙하나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