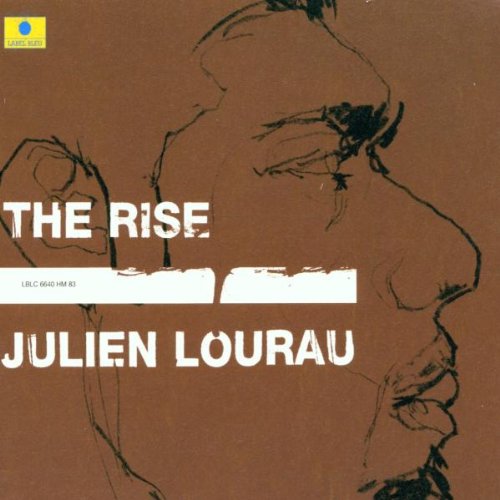줄리앙 루로가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이런 서두로 시작하면 상당수의 국내 재즈 애호가들은 이 친구가 누군데 그럴까?하는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줄리앙 루로(거의 ‘호’로 발음된다)는 현재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일렉트로 재즈의 선봉역할을 했던 프랑스의 색소폰 주자다. 라벨 블레를 통해 그루브 갱이라는 팀으로 일렉트로 재즈의 가능성을 시도했던 때가 1995년이었으니 가히 선구자 중의 선구자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젊다.) 특히 그가 워너로 이적해서 발표했던 <Gambit>(2000)은 실험성과 강박적 하우스 비트가 어우러진 멋진 앨범이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다는 것은 국내는 아직 생소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일렉트로 재즈 애호가들에게는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앨범은 그를 정작 기다린 애호가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 오히려 다른 쪽, 그러니까 온건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애호가들에게 뜻밖의 만족을 줄 수 있겠다. 이번 앨범은 라틴이나 마그레브 성향의 리듬을 배경으로 연주자로서의 줄리앙 루로가 전면에 나서는 그만의 과거 회귀적인 연주를 담고 있다.
줄리앙 루로가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이런 서두로 시작하면 상당수의 국내 재즈 애호가들은 이 친구가 누군데 그럴까?하는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줄리앙 루로(거의 ‘호’로 발음된다)는 현재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일렉트로 재즈의 선봉역할을 했던 프랑스의 색소폰 주자다. 라벨 블레를 통해 그루브 갱이라는 팀으로 일렉트로 재즈의 가능성을 시도했던 때가 1995년이었으니 가히 선구자 중의 선구자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젊다.) 특히 그가 워너로 이적해서 발표했던 <Gambit>(2000)은 실험성과 강박적 하우스 비트가 어우러진 멋진 앨범이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다는 것은 국내는 아직 생소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일렉트로 재즈 애호가들에게는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앨범은 그를 정작 기다린 애호가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 오히려 다른 쪽, 그러니까 온건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애호가들에게 뜻밖의 만족을 줄 수 있겠다. 이번 앨범은 라틴이나 마그레브 성향의 리듬을 배경으로 연주자로서의 줄리앙 루로가 전면에 나서는 그만의 과거 회귀적인 연주를 담고 있다.
일렉트로 재즈의 성장의 주역으로 그를 바라보던 와중에 대부분의 그를 알고 있던 애호가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면 바로 메인스트림 쪽과 유럽의 진보적 음악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어쿠스틱한 감성일 것이다. 아니 보다 눈썰미가 있었던 애호가라면 <Gambit>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연주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그가 일렉트로 재즈를 생산해 내는 방법 자체가 그의 어쿠스틱 연주 위에 DJ가 리믹스를 해나가는 것이었던 만큼 <Gambit>은 이전과의 단절이 아니었고 또한 이번 앨범도 <Gambit>과의 단절은 아닌 셈이다. 사실 이 앨범의 뒷면에서도 감사의 표시를 밝히고 있듯이 그의 재즈 인생의 시작에는 일렉트로 재즈가 아닌 애비 링컨이 있었다. 국내 애호가들 중에 그녀의 1994년도 앨범 <A Turtle’s Dream>을 기억할 것이다. 그 앨범에서 멋진 발라드 연주를 했던 이가 바로 루로였다. 그리고 그는 이 앨범에도 참여하고 있는 앙리 텍시에의 노마드적 서정이 깃든 앨범들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초기 음악적인 부분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 앨범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다.
이 앨범을 들으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왜 라틴, 마그레브성향이 강한 리듬을 배경으로 선택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연주에서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선택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 리듬의 선택이 아주 적절한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색소폰은 소니 롤린스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음색으로 경쾌함보다는 약간은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이 강했다. 게다가 이번 앨범에 그의 개인적 비극이 관련되면서 그의 연주에는 고뇌와 비운의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 이국적인 리듬이 그의 색소폰을 감싸면서 이 어두움을 살짝 전환시킨다. 그래서 앨범에 흐르는 기조는 단순한 비관적인 면이 아니라 때로는 명상적이기까지 한 편안함과 부드러움이다. 그의 색소폰은 종종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상태에 빠지곤 하지만 결코 감정의 과잉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 곡에서는 스탄 겟츠를 연상하게 하는 부드러움마저 발견된다. 그러므로 서서히 감정의 흥분상태로 감상자를 인도하는 ‘The Rise’나, 라틴 보컬의 달콤함을 감싸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Contigo Distanci’가 비슷한 음악적 무게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부자유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는 이 앨범이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보다 참여한 연주자들의 성향을 적극 수용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실제 이번 앨범에는 애비 링컨의 발라드적인 면을 기조로 앙리 텍시에의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긴장의 음악, 그리고 지난 해 또다른 프랑스의 수확이라 할 수 있는 말릭 메자르디의 마그레브 성향의 분위기가 어우러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드러움과 가벼움이라는 그 자체에 경도되지 않고 줄리앙 루로만의 부드러움, 가벼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내 개인적인 느낌은 아주 기분 좋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느끼는 적당한 포만감같은 것이었다.
그의 변화가 새롭기도 하지만 앨범이 주는 진지한 멜랑콜리는 이 앨범을 한번 분위기 좋게 듣고 구석에 방치하는 앨범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적극 필청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