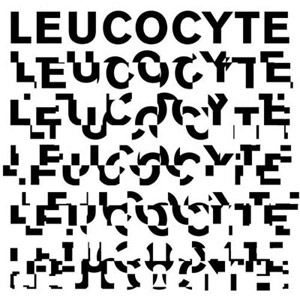에스뵤른 스벤슨의 유작이 되어버린 E.S.T의 마지막 앨범이다. 앨범 타이틀은 백혈구를 의미하는데 갑작스레 왜 피와 관련된 의학 용어를 앨범 타이틀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음악을 듣다 보면 그가 자신의 내면을 파고드는 것을 관념, 정서적 관점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앨범에 담긴 사운드는 여전하다. 트리오 멤버가 각각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고 또 여기에 자신만의 일렉트로닉스를 가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조금은 덜해졌지만 정점을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치닫는 듯한 느낌도 여전하다.
그런데 에스뵤른 스벤슨의 사망을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이겠지만 이 앨범을 들으면서 나는 그가 물 속의 세계, 실제적인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그 세계의 음악을 그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일렉트로닉스의 공간적 효과, 물먹은 듯한 피아노의 질감 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작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렉트로닉스로 어떤 공간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안의 정서에 자극을 받아 솔로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리고 그저 불나방처럼 나락을 모른 채 달리는 듯한 사운드도 모든 것이 울렁거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물 속 세계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액체 세계가 이번에는 백혈구의 세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그 세계는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에스뵤른 스벤슨이 다이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에 인과관계를 상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