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나 전공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알베르 카뮈에게 빠질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만 70년대 후반을 이야기한 어느 소설에서 남녀가 버스를 타고 데이트를 할 때 니체와 카뮈를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읽었던 적이 있다. 그 정도로 70년대 청춘들에게 카뮈는 제임스 딘, 쳇 베이커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불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후에도 카뮈의 <이방인>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했다고 본다. 나 같은 경우도 <이방인>, <페스트> 등의 소설과 <결혼, 여름> 등의 에세이에 빠졌던 적이 있다. 아울러 그의 글쓰기 욕망을 자극했다는 앙드레 드 리쇼의 <고통>, 그의 스승인 쟝 그르니에의 책들로 독서를 확장하게 하기도 했다.
이 책은 1960년 1월 3일 갈리마르 출판사의 사장이었던 미셀 갈리마르 가족과 함께 차로 파리로 향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카뮈의 마지막 날을 탐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과 작가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소설이다. 프랑스에는 이런 류의 문학이 나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 같다. 지난 해 읽었던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상상으로 복원한 크리스틴 오르방의 소설 <세상의 근원>도 그랬고 아직 읽지 않았지만 1949년 마일스 데이비스가 파리에 처음 왔을 때를 상상으로 복원했다는 소설 <Le Moment Magique>도 그랬다.
사실 카뮈의 마지막 날은 매우 단순했다. 이틀에 걸쳐 파리로 가는 승용차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저자는 그 차 안에서 그가 여러 생각을 했으리라는 가정 하에 아직 다 쓰지 못한-결국 미완으로 남게 될-소설 <최초의 인간>에 대한 부담, 알제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의 아련한 관계, 알제리 독립 운동에 대한 그의 정치적인 자세,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의 좌,우파의 시기 어린 공격, 특히 사르트르와의 결별 등을 이야기 한다. 그렇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인간 알베르 카뮈를 조망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마치 1960년 1월의 사고를 운명적인 것으로 만드는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무의식 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꼴이 되는 것이다. 현재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카뮈에게 만큼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려 했던 그에게 결정론적 사망이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운전대라도 잡았다면 모를까. 제임스 딘같은 사망도 아니지 않은가?
이러한 부담을 작가도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소설이 끝난 이후 후기 형식으로 카뮈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알제리 독립전쟁에 관련된 좌,우파 논객들의 비판이 카뮈의 사망 이후 어떻게 그를 추앙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상상이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카뮈가 마지막 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에서 나아가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더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리라 본다.
한편 저자는 카뮈의 문학, 사상을 (충만한 의미로서의) 침묵에 기반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특히 잘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말도 어눌했던 그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 사랑의 관계가 그의 문학적 감수성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출발해 알제리가 고향인 그가 알제리 독립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을 아끼게 되었던 것까지 설명한다. 이 부분은 그럴싸하고 자못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소설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큰 재미를 느끼기 힘들었다. 카뮈 같은 감동을 주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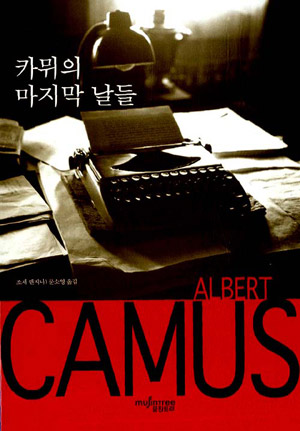

까뮈는 20대 초반 뒤늦게 사춘기를 맞아 방황할 때 그 마음을 잡아준 작가였습니다. 까뮈가 너무 좋아 번역하신 김화영 교수님까지 검색해볼 정도였으니까요. 김화영 교수님의 그 당시 홈피는 학생들하고 굉장히 소통적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까뮈는 부조리를 가슴서늘하게 섬세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시지프신화에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희망’도 거부하는게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부조리로 가득한 실존 그자체를 단지 그냥..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낯선청춘님 글 보면, 현재의 삶에 치여 제가 잊고 있었던…하지만 무척이나 소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20대 초반에 카뮈를 읽었습니다. <이방인>, <페스트> 등의 소설과 <결혼 여름>, <시지프 신화> 등의 글을 읽으며 좋아했었죠. 그냥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실존주의도 어설프지만 이해하고 공감했었습니다. 그 때가 제 삶의 여름이었네요.ㅎ
제가 님께 무엇인가 좋은 영향을 준다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ㅎ
아이쿠.. 이 훈훈한 분위기~^^
그리고..’그 때가 제 삶의 여름’이었다는 표현이 참 좋으네요..멋집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ㅎ
ㅋㅋㅋㅋㅋㅋㅋ ;;; 웃긴데 짠합니다.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현된 언어와 실제 경험사이의 괴리가 어렴풋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런 모순적 감정을 느끼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알면서 부정하고픈 현실이겠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