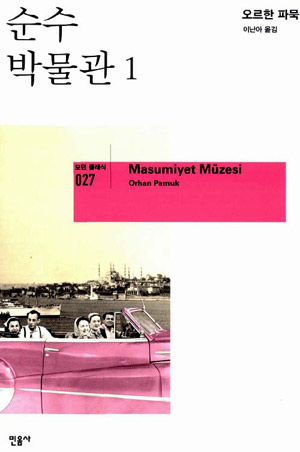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터키 출신의 작가 오르한 파묵의 소설이다. 그는 앞으로 이 소설로 자신이 기억될 것이라 말할 정도로 이 소설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소설은 약혼을 앞둔 터키의 부자 남성이 한 아름다운 여인에 홀딱 빠져 44일간 몰래 사랑을 나누고 사라진 그녀에 괴로워하며 약 1년간 그녀를 찾아 다니다가 약 7년간 그녀를 지켜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다. 아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집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들 중 상당수는 사랑보다는 집착에 놀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지도 모른다. 특히 여성 독자들은 무서워할 지도. 하지만 요즈음의 사랑은 혼자만 좋아하는 사랑 대부분을 집착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반대로 이 소설을 통해 이런 사랑도 가능함을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소설의 줄거리는 8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도 상당히 단순하다. 따라서 섬세한 문체를 통해 작가가 그려내는 주인공 케말의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녀 퓌순이 사용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모은다. 그녀를 만나지 못할 당시 머리빗, 그녀가 마셨던 유리잔 등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느끼면서 시작된 것인데 어찌 보면 도착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순간의 기억은 장소와 사물을 통해 기억되지 않던가? 그러므로 퓌순과 관련된 물품을 케말이 수집하는 것은 사라지는 기억을 고정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 싶다. 또 그런 정성이 있었기에 결국 사랑을 되찾게 되지 않던가? 이런 부분은 마르셀 프루스트-파트릭 모디아노와 유사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책의 제목이 순수 박물관인 것은 케말이 그렇게 모은 퓌순과 관련된 수천 가지의 물건들-수천 개의 담배꽁초, 향수병, 숟가락, 엽서, 카페 메뉴판, 사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을 모아 세상을 떠난 퓌순을 기리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설은 이 순수 박물관의 이해를 위한 안내서의 성격을 띤다. 케말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에게 부탁하여 쓰게 한.
한편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시간을 아우르면서 소설은 당시 터키 사회의 풍경을 상당히 섬세하게 묘사한다. 특히 부유한 계층에 대한 묘사와 영화계에 대한 묘사는 실제 터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듯 싶다.
다시 말하지만 이 소설의 정서는 한국의 젊은 층에 다가가지 못할 확률이 크다. 하지만 누군가를 절절히 좋아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나? 난 공감한다. ㅎㅎ 그러나 과연 오르한 파묵이 이 소설로 기억될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