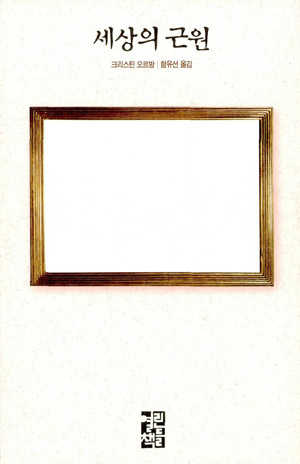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구스타브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1866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당시의 누드화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아니 지금도 파격적이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여성의 음부 부분을 클로즈업해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대중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았다. 소유했던 사람들도 그림을 가리는 다른 그림을 앞에 붙이고 있다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 책의 표지가 빈 액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그러다가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자끄 라깡이 최종 소유하게 되었고 그의 사후 상속세 대신 1995년 오르세 미술관에 기증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 경우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았는데 그다지 큰 느낌을 받지 못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의문 정도? 아마 지나치며 보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 그림이 55cmx46cm의 크기로 제작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당시 큰 그림들을 보다가 이 그림을 보았기에 세부적인 면을 관찰할 생각을 안 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 이전에 나는 이 그림의 제목이 ‘L’Origine du Monde 세상의 근원’임을 몰랐다.
이 소설은 바로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이 그려진 뒷이야기를 상상으로 복원하고 있다. 내용 안에 등장하는 제임스 휘슬러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세상의 근원’의 창작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허구다. 저자는 그 그림의 모델을 조안나 히퍼넌이라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그녀가 제임스 휘슬러를 떠나 쿠르베에게 오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꾸민다. (그래서 이 소설의 원제목이 ‘J’etais l’origine du monde 나는 세상의 근원이었다’다) 이러한 그림 창작에 관한 소설 가운데 유명한 것은 베르메르의 그림을 소재로 한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진주 귀고리 소녀>가 있다. 나도 이 소설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크리스틴 오르방의 이 소설은 그러한 재미 특히 서사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재미를 주지 않는다. 분량도 짧지만 조안나 히퍼넌이 쿠르베에게 오고 그의 요구대로 모델이 되어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세상의 근원’이 단순한 여성 음부의 세밀한 묘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 현재와 과거를 담지하고 있는 비어 잇는 중심을 표현하려 했고 나아가 신의 창조에 맞먹는 걸작에 대한 쿠르베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사실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 그림과 ‘세상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보면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