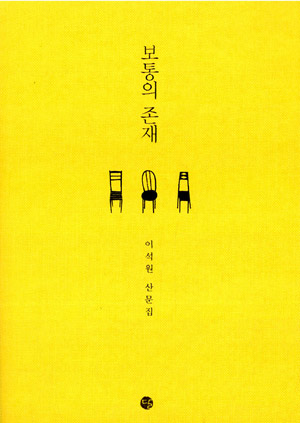나는 (자전적) 에세이를 즐기지 않는다. 어릴 적에 이런 류의 글을 좀 읽었던 경험이 이리 만들었다. 대부분의 에세이들은 저자를 착하고 속이 깊은 이미지로 드러내곤 하는데 그것이 이젠 싫다. 그 가벼운 분위기가 싫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의 글을 읽기보다 나의 삶을 느끼고 그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에세이를 그럴싸하게 쓰려는 모순된 마음!
그럼에도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선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실 난 저자가 록 그룹 ‘언니네 이발관’의 그 이석원인지 몰랐다. 언니네 이발관 5집 앨범 타이틀이 <가장 보통의 존재>임에도 말이다. (사실 언니네~의 음악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섯 장의 앨범을 조금씩 들어보니 괜찮더라.) 책의 저자 소개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저자의 친구 가운데 한 명-내게 언니네~공연을 같이 보자고 권했던, 그러나 내게 거절당했던-이 책에 자신이 언급되었다며 지난 해 마지막 날 내게 선물을 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첫 느낌은 다른 에세이들과 비슷하면서도 톤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에세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삶의 긍정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보통의 존재’는 비슷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더 집중한다. 그러니까 희망, 삶의 긍정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만들어 온 듯하면서도 이제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저자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양가적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며, 가끔 사람이 그리워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사랑한다. 또한 자신의 건강 문제, 이혼 등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풀어내면서 자신이 사실은 함께 하기 힘든 까다로운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래도 이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려 한다고 밝힌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저자의 성장 고백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삶의 경구성 구절들이 거북스럽지 않다.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이런 깨달음으로 이어졌음을 알기 때문이다. 결코 ‘삶은, ~은 이런 것이다’는 식의 명령조를 띄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미니 홈피 등에 감상적 문구를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보물창고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잊지 말기 바란다. 그 문구를 만들어 낸 저자의 삶을.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그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자가 썼던 일기를 정리한 것인 듯하다. 타인을 의식한 일기가 일기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인식했기에 더욱 공감 가는 일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에 일기, 글쓰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한 부분이 그래서 나는 공감이 간다. 평소의 내 생각과 같다. 나아가 이 책에 담긴 이석원이라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살펴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다. 독자이기에 공감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파수가 통한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살짝 뒤로 하며 적절히 조직과 가족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일기를 썼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매일 썼던 일기는 태워버렸다. (어느 글에서 이를 밝힌 적이 있다.) 그 뒤로 부정기적으로 일기성 글을 썼었는데 블로그를 하면서 쓰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볼까 생각이다. 모르는 새에 재즈 듣기가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렸는데 이 기회에 이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나저나 저자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지 몇 개의 글을 첨삭한 새로운 판이 나왔다고 한다. 그거 참……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