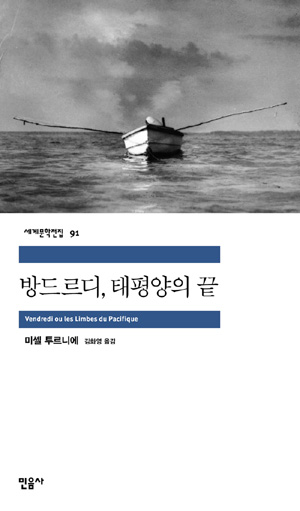10여년 전에 원서로 한 번 읽어보겠다고 덤볐다가 정교한 불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던 책을 이번에 번역본으로 읽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 책은 다니엘 데포의 소설 <로빈손 크루소>의 이야기를 새로이 쓴 것이다. 비약한다면 재즈적인 해석이라고나 할까? 미셀 투르니에가 새로이 쓴 로빈손 크루소의 이야기는 다니엘 데포의 로빈손 크루소와는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다. 다니엘 데포가 원시 환경에서 서구 문명의 성공을 그리고 그가 구출한 프라이데이를 그 문명을 실현하는데 부수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면 미셀 투르니에는 보다 철학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물론 그의 로빈손도 무인도에 그가 자란 영국 사회의 체계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야말로 타자(他者)의 부재가 주는 버려지고 소외된 느낌, 야생의 느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곡식을 키우고 집은 만들며 문명 사회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무인도를 자신의 왕국처럼 만들어버린다.
그가 우연히 생명을 구해준 방드르디-프라이데이의 프랑스어 표현-도 그에게는 계몽시켜야 할 존재다. 하지만 방드르디를 알게 되면서부터 로빈손의 왕국은 무너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가 야생의 삶에 길들여져 간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철학적이고 종교적-기독교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인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포기하고 그를 떠난 방드르디 대신 쥬디-목요일-를 데리고 다시 새로운 무인도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러한 내용의 전개를 통해 미셀 투르니에는 로빈손 크루소만큼이나 방드르디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명사회의 허점을 드러내고 자연적, 야생적 삶의 매혹을 강조한다. 그래서 로빈손 크루소와 방드르디는 상당히 대조적인 방향으로 그려진다. 로빈손 크루소가 어두운 동굴을 중심으로 거처를 설정했다면 방드르디는 태양과 가까운 해안에 머무르길 좋아하며 웃음을 잃어버린 로빈손과 달리 방드르디는 웃음을 지을 줄 안다. 그리고 로빈손은 서구 문명 사회의 발전을 무인도에 이식하려 하면서 과거와 연관된 삶을 살지만 방드르디에게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서술을 전개하는 치밀한 방식부터, 종교, 철학적인 화두 등에 있어 이 책은 다양한 문학 비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을 쓸 무렵 미셀 투르니에가 레비 스트로스의 인류학에 관심을 두었고 그와 친분이 있었던 들뢰즈가 이 소설을 근거로 타자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국 이 소설은 타자를 중심으로 한 전복적 사고를 유도한다고 하겠다. 한 인간이 문명 사회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자연인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그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의 한국어 제목은 살짝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일단 프랑스어 제목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를 옮김에 있어 ‘ou’ 그러니까 ‘혹은’이라는 단어를 누락시켰다. 한국어 제목은 방드르디가 태평양의 끝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미셀 투르니에는 방드르디와 함께 무인도라는 공간을 강조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을 해석한 김화영 교수도 밝혔지만 ‘태평양의 끝’에서 ‘끝’에 해당하는 ‘Limbes’는 1차적으로 가장자리로 해석되지만 복수로 사용되면서는 고성소(古聖所) 혹은 해소(孩所), 그러니까 일종의 연옥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로빈손이 머문 무인도는 문명 세계와 종교적 깨달음의 세계 중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방드르디의 모습에서 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의 주인공 ‘그리스인 조르바’를 떠올렸다. 생의 순간적 약동의 힘을 지닌 모습이 유사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