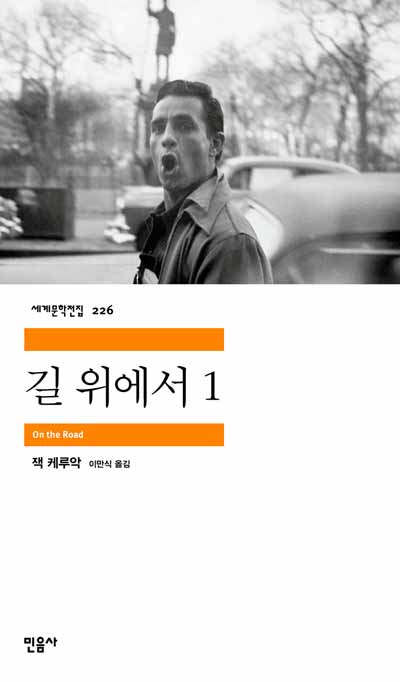잭 케루악의 소설을 드디어 읽었다. ‘드디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 소설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음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탐 웨이츠 같은 음유 시인 형 음악인들 이야기에 잭 케루악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비트 세대(Beat Generation)의 기수인 잭 케루악과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재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더 읽고 싶어졌다. 그런데 원서로 읽기가 좀 그래서 미루어왔다. 그리고 발간되자마자 운명처럼 선물로 소설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간 읽기를 주저했다.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서 읽게 되었다.
잭 케루악의 소설을 드디어 읽었다. ‘드디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 소설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음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탐 웨이츠 같은 음유 시인 형 음악인들 이야기에 잭 케루악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비트 세대(Beat Generation)의 기수인 잭 케루악과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재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더 읽고 싶어졌다. 그런데 원서로 읽기가 좀 그래서 미루어왔다. 그리고 발간되자마자 운명처럼 선물로 소설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간 읽기를 주저했다.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서 읽게 되었다.
이 소설은 여러 번 정독하고 한 편의 논문을 쓰고 싶을 만큼 생각하고 발전시킬 화두가 많다. 그래도 약 3주간 긴 두루마리 종이에 되는대로 타이핑을 해가며 써 내려간 창작 과정을 생각해 나 또한 되는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소설은 일단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흔히 말하는 젊음의 반항적 기질을 자극한다고 할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1940년대 미국의 사회체계에 순응하지 못한, 때로는 소외된, 그래서 길 위에 놓여진 젊음들이다. 그들에게는 내일에의 목적도 희망도 없다. 그렇다고 비관적이라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순간을 즐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 끝 뉴욕에서 서쪽 끝 샌프란시스코를 이웃 동네 가듯 오가고 나아가 멕시코까지 여행을 가곤 한다. 그리고 그 여행은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히치하이킹이 필수인 무전 여행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유랑을 반복할까? 소설의 화자인 샐 파라다이스나 주인공의 느낌이 강한 딘 모리아티는 안정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는 생활을 하다가도 충동처럼 집을 나서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덴버, 샌 프란시스코, 뉴 올리언즈, 뉴욕에 있는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랄까? (사실 그 큰 미국 땅으로 대수롭지 않게 오가는 것도 놀랍지만 그 곳곳에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놀랍다.) 그냥 그들은 길이 있기에 떠날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떠남에 대해 어느 정도 특별한 구별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결코 자신들을 부랑자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래도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는지. 실제 샐 파라다이스는 늘 뉴욕으로 돌아오고 딘 모리아티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 그들이 돌아오는 곳이 부모가 부재하고 정착할 안정적인 직장도 부재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들은 떠나고 돌아온다. 그러면서 청춘을 소비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멕시코 여행은 일종의 구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통제된 미국 밖으로의 여행, 남다른 자유를 느끼는 곳으로의 여행의 의미.
이 소설은 잭 케루악이 약 7년간 비슷한 유랑자적인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실제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샐 파라디이스는 잭 케루악 본인, 앨런 긴스버그는 카를로 막스, 윌러엄 버로스는 올드 불 리 같은 문학 동료들, 그리고 비트 세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닐 캐사디가 열정적인 천사 같은 딘 모리아티로 등장한다. 그 가운데 딘 모리아티는 대책 없는 자유인의 상징처럼 나오는데 그 느낌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한편 언급했다시피 이 소설은 재즈로 가득하다. 글쓰기 자체부터 재즈의 즉흥 연주를 따라 약 3주 동안 순식간에 써내려 간 것이다. 그리고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재즈를 즐긴다. 그래서 빌리 할리데이, 조지 쉐어링, 와델 그레이, 덱스터 고든, 슬림 갈라드 등의 인물들의 공연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며 그 밖에 스탄 겟츠, 마일스 데이비스 등의 이름도 언급된다. 그런 재즈를 언급하면서 소설은 재즈의 순간적이고 자유로운 열정이 그네들의 삶을 자극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런데 나는 이 소설에 언급된 재즈 공연, 인물을 접하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연주여행을 떠나는 당시의 연주자들을 생각했다. 그네들도 어떤 세련되고 우아한 여행보다는 피곤한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로 잭 케루악은 비트 세대의 대변인으로 추앙 받게 되고 소설의 영향을 받아 많은 젊은이들이 길 위로 한 푼 없이 나섰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효과일 것이다. 그보다 나는 사회 통제에 대한 젊은이의 방항이라는 것이 이후 다양한 예술적인 소재로 변용되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 영화 <고래사냥>도 이런 사회 부적응,소외 인물들의 여행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비트 세대, 비트 문화를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 소설은 1957년에 발간되었지만 사실은 1951년에 씌어졌다. 그 뒤 출판까지 이런저런 어려움과 변경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 두루마리에 타이핑한 첫 버전의 <길 위에서>를 또한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그것은 아닌 듯.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 속 시대는 1940년대 비밥이 한창일 때의 시대다. 그러면서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과 비교하게 된다. 잃어버린 세대는 1920년대 그러니까 뉴 올리언즈 재즈에서 스윙으로 넘어가는 세대였고 세계 대전 전이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젊은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가득한 사회에서 비트 세대처럼 소외된 면이 있었다. 그런데 비트 세대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잃어버린 세대는 그 소외의 불행으로 빠져들어갔다는 느낌이 강하다. 더 비교해봐야겠다. 또한 보리스 비앙의 <세월의 거품>에 나오는 재즈의 이미지와도 비교하면 재미있을 듯하다. <길 위에서>는 거칠고 열정적인 재즈라면 <거품의 세월>은 잘 편곡된 우아한 재즈의 이미지가 아닐지.
이 소설을 읽으며 내 20대 초반 시절 습관처럼 떠났던 1박 3일의 여행들이 생각났다. 그 때 난 이유 없이 서울을 떠나 혼자 여기저기를 걷곤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곳인 강릉 부산에서 여행을 마치곤 했다. 그것이 이후 유럽으로 이어졌는데 그 때의 떠남을 다시 한 번 가져보고 싶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