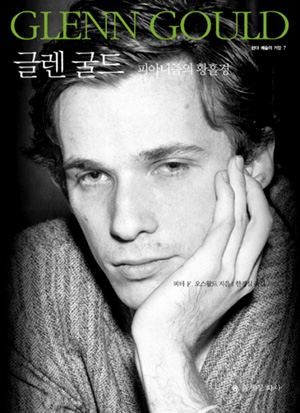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단숨에 읽어버린 책. 분량이 550여페이지가 되어서 완독에 쉽지 않았다.
글렌 굴드는 다른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에 비해 훨씬 더 신비로운 위치를 차지한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아마 그의 연주를 잘 듣지 않아서 더 그랬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의 신비는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주어서가 아니라 그만의 연주를 들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일찍 연주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30대 초반의 한 창 나이에 무대를 떠나 스튜디오로 들어가고 그 곳에 머무르면서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과감하게 얼터너티브 테이크를 녹음하고 편집을 하여 이상적인 버전을 만들어 낸 그의 활동은 분명 특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기를 통해 본 글렌 굴드의 삶은 그 이상의 특별한 것도 없다. 특이한 연애담도 없으며 큰 사건도 없다. 그는 피아노를 배웠고 어린 나이부터 무대에 섰으며 일찍이 스튜디오로 들어가 독특한 방식으로 연주를 녹음하고 나아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 책은 전혀 심심하지 않았다. 글렌 굴드의 친구로 가까이 그를 지켜본 저자는 그가 왜 무대를 싫어하고 나아가 관객들을 혐오했는지 또 왜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사용했으며 여름에도 두터운 옷을 입을 정도로 자신의 건강에 민감했는지를 자신의 전공인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밝힌다.
그런데 저자는 서술을 통해 글렌 굴드가 다소 기이한 건강 염려증-그의 삶은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일찍 사망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의 하나이기도 하다-부터 무대 혐오증 등이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는 연주자인 동시에 작곡가가 되고 싶어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수많은 고전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빠르고 느리게 연주하며 모습을 바꾸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도 스튜디오에서의 편집 등을 사용하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버전, 자신이 음악 그 자체인 버전을 꿈꾸었다고 본다. 어찌 보면 그는 재즈나 록 연주자 같은 느낌도 준다. 작곡가나 악보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충실한 연주를 펼친다는 점에서는 분명 재즈 연주자이고 편집으로 이상적인 스튜디오 버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에서는 록 뮤지션을 닮았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는 글렌 굴드가 차라리 재즈의 세계에 빠졌었다면 키스 자렛 이상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특히 연주를 따라 신음하는 그의 스타일은 키스 자렛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지 않던가?)
한편 음악을 작곡가가 아닌 연주자 중심 나아가 새로운 창조자로서의 연주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의 태도는 얼마 전 읽었던 에드워드 사이드의 <음악은 사회적이다>에서 왜 글렌 굴드가 언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