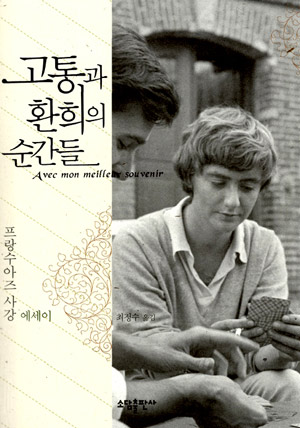내가 아주 어릴 때, 유아였을 때 <슬픔이여 안녕>을 중심으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열풍이 불었던 것 같다. 전혜림처럼 말이다. 그 열풍이 잠잠해 진 이후에 나는 프랑수아즈 사강을 알았다. 하지만 그땐 그냥 소녀 풍의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프랑수아즈 사강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녀를 여장부로 생각할 것 같다. 이 책은 그녀가 49세에 발표한 자전적인 에세이다. 그녀의 지난 삶 가운데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주고, 환희를 주었던 사건,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프랑수아즈 사강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게 한다.
그녀는 도박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벌었던 돈을 다 탕진하기도 했다. 또 복구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도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글을 읽다 보면 ‘나도 한 번’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녀는 도박이 주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박 그 자체를 즐겼기에 이를 극복했던 것 같다. 운명과의 싸움 같은 것이랄까? 특히 수만 프랑을 잃다가 복구하여 100프랑 정도를 잃은 사람이 ‘나 오늘 100프랑밖에 잃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심리를 서술한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도박장의 빈곤한 청소부가 그날 수만 프랑을 잃은 백만장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상황과 함께 도박장 특유의 파토스를 느끼게 한다.
또한 그녀는 생트로페가 휴양지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친구들을 불러 시대를 앞서는 파티를 즐겼던 것 같다. 그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다. 그러면서도 이후 선구자를 따라 많은 파리인들이 그곳에 별장을 짓고 주민들이 카페, 바 등을 열며 변화에 맞추고, 그래서 생트로페가 유희의 장소로 변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인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만의 장소가 사라졌다는 불평으로 읽히진 않는다. 나는 폴 시냑의 ‘생트로페의 소나무’라는 그림을 좋아한다. 이 때문인지 생트로페의 변화를 이야기한 이 부분이 색다른 감흥으로 다가왔다. 그림이 사라지는 느낌?
이 외에 그녀가 쓰고 올린 연극에 대한 이야기들도 흥미로웠다. 그리고 오손 웰즈, 테네시 윌리엄즈, 쟝 폴 사르트르 등과의 인연, 존경,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도 좋았다. 그래도 내 관심을 가장 많이 끝 것은 첫 장을 장식한 빌리 할리데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빌리 할리데이를 뉴욕에서 만나고 다시 프랑스에서 만났던 것에 대한 담담한 서술이지만 그 속에는 간접적으로 당시 빌리 할리데이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귀여운 외모의 백인 젊은 여성과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겠지만) 삶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흑인 여성의 만남이 극적인 상상을 하게 해주었다.
확실히 프랑수아즈 사강은 모던한 여성이었다. 재즈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스피드를 좋아하고 파티를 즐겼던 여성. 따라서 그녀에게서 소녀적 감성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