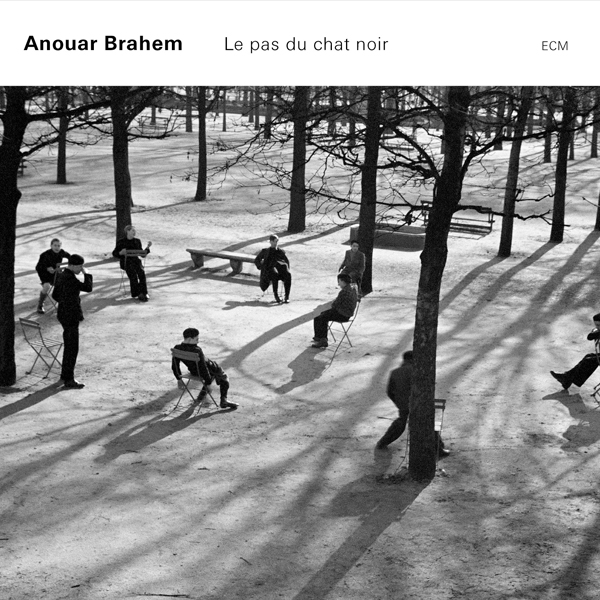우리나라의 황병기 선생만큼이나 국보급으로 인정을 받는 튀니지의 우드 연주자 아누아 브라헴이 현대 유러피안 재즈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그는 아랍 고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단순히 아랍음악의 재즈화같은 차원의 음악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아랍인으로서 바라본 서양음악의 모습이랄까? 서양음악을 그대로 포용하면서 그것을 아랍적 모드로 풀어내어 어느 쪽에서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을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음악은 아랍과 서양 음악의 이미지들이 중첩되면서 매우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Jan Gabarrek, Richard Galliano, Dave Holland, John Surman, 그리고 Erik Truffaz와의 협연 등 어떠한 연주자와 어떠한 스타일의 음악 앞에서도 그만이 지닌 독특한 사운드는 금방 인식이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황병기 선생만큼이나 국보급으로 인정을 받는 튀니지의 우드 연주자 아누아 브라헴이 현대 유러피안 재즈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그는 아랍 고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단순히 아랍음악의 재즈화같은 차원의 음악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아랍인으로서 바라본 서양음악의 모습이랄까? 서양음악을 그대로 포용하면서 그것을 아랍적 모드로 풀어내어 어느 쪽에서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을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음악은 아랍과 서양 음악의 이미지들이 중첩되면서 매우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Jan Gabarrek, Richard Galliano, Dave Holland, John Surman, 그리고 Erik Truffaz와의 협연 등 어떠한 연주자와 어떠한 스타일의 음악 앞에서도 그만이 지닌 독특한 사운드는 금방 인식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 앨범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서양 음악의 정적인 부분과 아랍 음악의 신비적인 분위기를 보다 더 극대화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그의 작곡의 중심은 자신이 연주하는 우드가 아니라 피아노다. 서양음악을 혼자서 표현하기에 문제가 없는 피아노를 중심에 놓고 그의 음악은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피아노 선율을 아랍적인 것으로 채워놓았다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그가 피아노를 위해 설정한 분위기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성격이 강하다. 워낙 프랑스 인상주의를 반영한 음악들이 많기에 혹자는 그저 그런 음악 이미지의 설정을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브라헴이 불어넣은 인상주의의 이미지는 단지 양식적인 것이 아니다. 인상주의의 분위기 외에도 그가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서양적 선율미이다. 그래서 모든 곡들이 지닌 선율의 아름다움에 무엇보다도 감상자는 매료되고 만다. 그 선율들은 깊은 슬픔, 회한과 우수에서 시작해 절대적 무한에의 동경으로 확장되는 ‘인상’을 준다. 무척이나 감성적인 동시에 선적이다.
음악의 전개 양상을 볼 때 François Couturier의 인상주의적 피아노와 브라헴의 아랍의 신비주의적인 우드는 대립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 음악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대립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점을 찍어 나가듯 충분한 여백을 갖고 진행되는 피아노와 마치 말을 머뭇거리듯 한 음씩 힘들게 멜로디를 뽑아내는 우드의 진행은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 들어가 유니즌 아닌 유니즌 연주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브라헴이 이 앨범의 기조를 인상주의 음악에 맞춘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 즉, 그는 이전까지 선보였던 우드 연주의 동양적 신비가 서구 인상주의 음악이 지닌 정적인 면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대립되는 듯한 두 악기와, 두 분위기는 이질감을 넘어 동질성을 향한다. 이 두 상이한 요소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처럼 작용한다. 여기에 추가되는 Jean-Louis Matinier의 아코디언 연주는 두 악기간에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긴장마저 화해시키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등장했다 사라짐을 반복한다.
이 앨범에서도 그의 음악은 두 국이 영화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만큼 회화적 공간을 지향한다. 그것은 그의 음악이 월드 뮤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감상자를 이끄는 곳은 모든 것이 정지하고 오로지 정신의 에테르만이 부유하는 침묵과 어둠의 공간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서구인들에게 브라헴의 음악이 휴식의 음악으로서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이러한 음악 이미지의 형성에는 녹음이라는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음반을 플레이어에 걸고 5초 후에 시작되는 피아노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충분한 공간적 여백과 함께 다가오는 현실감에 실연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워낙 잘 만들어진 사운드로 정평이 나있는 ECM이지만 이번 브라헴의 앨범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잘된, 그래서 음악적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녹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도 올 해에 만난 훌륭한 수작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