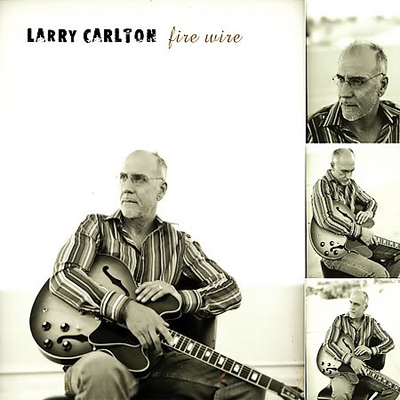래리 칼튼을 음악적으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퓨전 재즈 기타 연주자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이다. 실제 그는 리 릿나워와 함께 퓨전 재즈 기타의 인기를 양분해 온 스타급 연주자다. 그래서 그의 음악적 본령은 블루스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기타 연주자 자체를 좋아하는 감상자들이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지난 2003년도 앨범 <Sapphire Blue> 앨범이 블루스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감상자들은 적잖이 놀랐다. 사실 이전에도 래리 칼튼의 블루스 연주는 간간히 있어 왔다. 하지만 앨범 전체가 블루스라는 사실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래리 칼튼을 음악적으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퓨전 재즈 기타 연주자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이다. 실제 그는 리 릿나워와 함께 퓨전 재즈 기타의 인기를 양분해 온 스타급 연주자다. 그래서 그의 음악적 본령은 블루스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기타 연주자 자체를 좋아하는 감상자들이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지난 2003년도 앨범 <Sapphire Blue> 앨범이 블루스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감상자들은 적잖이 놀랐다. 사실 이전에도 래리 칼튼의 블루스 연주는 간간히 있어 왔다. 하지만 앨범 전체가 블루스라는 사실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런 블루스에 대한 래리 칼튼의 관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닌듯하다. 이제는 스스로 나이가 들면서 표피적 세련됨 자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인기에 상관없이 하기로 마음 먹을 것일까? 실제 지난 앨범 <Sapphire Blue>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한 앨범이기에 매우 즐거운 작업 이었으며 이것은 이전에는 음반사의 난색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무튼 RCA로 이적한 이후 그는 블루스 연주로 완전히 음악적 방향을 바꾸어 버렸다. 그렇다고 래리 칼튼의 블루스가 전통적인 땀 냄새가 물씬 풍기는 투박한 사운드를 지향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래리 칼튼이 그런 블루스를 시도했다면 그다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블루스는 그저 래리 칼튼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세련된 맛이 있는 블루스가 나름대로 그의 블루스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CA를 통해 두 번째 내놓는 이번 앨범 역시 블루스가 전체를 지배한다. 그러나 지난 앨범에서 보다 더 다양해진 사운드가 래리 칼튼의 블루스가 분위기의 표현을 넘어 기타 연주자로서의 래리 칼튼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적절한 교차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느껴진다. 지난 앨범이 블루스의 흥겨움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그의 전형인 부드러운 퓨전 재즈 기타 사운드와 블루스 기타가 공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를 위해 지난 앨범에서 아주 큰 즐거움을 주었던 사파이어 블루 혼 섹션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다양한 톤과 힘의 조절을 강조하는 래리 칼튼의 기타를 보다 더 확연하게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톤의 다양성은 프레이징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70년대 록 기타의 전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굵은 선을 강조하는 연주이기에 프레이징의 전개 방식이나 음악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다. 바로 여기에 이 앨범이 지닌 대중적 매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련된 사운드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 단순한 맛이 도시적 세련미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