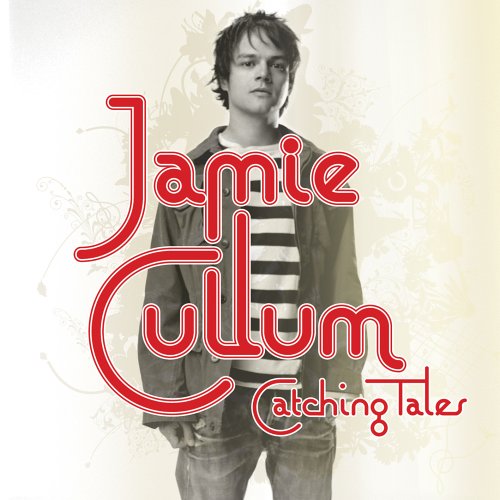얼마 전 우연히 제이미 컬럼의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고 또 끝까지 보지도 못했기에 나는 그 공연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치 축구장 정도로 넓은 야외 객석을 질서 정연하게 채운 관객들의 모습이다. 현재 과연 누가 저 정도의 관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재즈는 이제 클럽이나 콘서트 홀에서 공연을 하는 음악이 아니던가? 그러나 제이미 컬럼은 그 넓은 야외 객석을 꽉 채운 관객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이미 컬럼의 무대 매너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그는 육중해서 이리저리 옮기기 어려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도 이리 저리 뛰고 몸을 굴리며 마치 롹 기타 연주자의 공연과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러니 그 정도의 관객이 모이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과연 어떤 보컬이 어떤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날렵하게 뛰어 넘으면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우연히 제이미 컬럼의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고 또 끝까지 보지도 못했기에 나는 그 공연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치 축구장 정도로 넓은 야외 객석을 질서 정연하게 채운 관객들의 모습이다. 현재 과연 누가 저 정도의 관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재즈는 이제 클럽이나 콘서트 홀에서 공연을 하는 음악이 아니던가? 그러나 제이미 컬럼은 그 넓은 야외 객석을 꽉 채운 관객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이미 컬럼의 무대 매너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그는 육중해서 이리저리 옮기기 어려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도 이리 저리 뛰고 몸을 굴리며 마치 롹 기타 연주자의 공연과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러니 그 정도의 관객이 모이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과연 어떤 보컬이 어떤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날렵하게 뛰어 넘으면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을까?
사실 제이미 컬럼은 첫 앨범 <Pointless Nostalgic>부터 팝스타가 되고 싶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 <Twentysomething>을 통해 그 꿈을 이루었다. 한국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분명 제이미 컬럼은 현대 재즈의 새로운 남성 보컬의 경향을 대표한다. 실제 그의 보컬은 음색에 있어서 완숙미만 더한다면 프랑크 시나트라로 대표되는 크루너 보컬의 전형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이미 컬럼은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팝 적인 가벼운 보컬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팝 적인 보컬에는 일종의 껄렁껄렁함, 그러니까 나는 꼭 재즈 보컬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문제아적 정서가 담겨 있다. <Twentysomething>에 수록되었던 “Singin’ In The Rain”을 들어본 감상자라면 이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발매된 <Catching Tales>는 그 건들거리는 듯한 멋이 보다 더 극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말 젊기에 가능한 그런 보컬이라 할 수 있겠는데 CD를 빼곡하게 채운 16편의 노래들 모두가 그런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이번 앨범은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팝 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던 롹 같기도 하고 그저 평범한 팝 음악 같기도 한 곡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게다가 다양한 이펙터를 자신의 보컬에 입혀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이처럼 보컬까지 건드렸다는 것은 과연 이 앨범을 재즈로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게 만든다. 물론 앨범에 수록된 스탠더드 곡들은 제이미 컬럼 스타일로 편곡이 되었음에도 곡 자체의 아우라로 재즈적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변종적인 재즈가 등장하는 지금 제이미 컬럼의 음악은 전통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재즈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은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논쟁과 상관없이 이번 앨범 역시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예상된다. 사실 이를 노리고 앨범 전체가 기획된 것이 아니던가? 적어도 제이미 컬럼과 같은 20대 초반의 세대들은 재즈에 대한 큰 오해를 하게 될 지라도 제이미 컬럼의 음악에 호응을 보이며 즐기게 되지 않을는지. 한국에서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