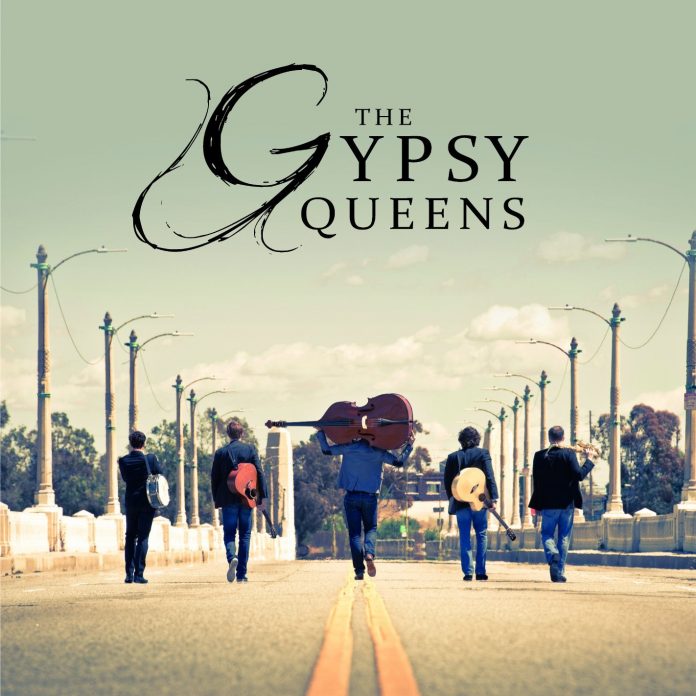자유로운 유랑자적 삶을 그리게 만드는 노래들

집시 민족은 방랑 민족이다. 이 집시 민족은 어디서 그 먼 방랑을 출발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오래 전에는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그래서 Gypsy라는 말은 Egypt에서 E를 묵음 시키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이 지배적이었지만 요즈음은 기원전 300년경 인도의 북쪽 어느 곳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집시 민족은 운명처럼 세계를 유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음악에도 끝없는 여정의 환희와 슬픔이 드러난다. 그들이 만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집시는 배척했을 지라도 집시 음악에 대해서는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그들 역시 집시의 음악을 들으며 방랑의 삶 속으로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모양이다.
이렇게 집시 음악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집시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집시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집시 음악은 당당히 세계의 주요 음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여전히 정처(定處)는 없지만 말이다.
우리가 듣고 있는 앨범의 주인인 5인조 밴드 집시 퀸즈도 집시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집시 혈통도 아닌데도 말이다. 이 그룹의 다섯 멤버는 각기 다른 국적을 지니고 있다.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디디에 카스나티는 이탈리아 출신, 드럼 연주자 마누엘 폴린은 멕시코 출신, 기타 연주자 앤더스 클룬데루트는 노르웨이 출신, 베이스 연주자 제이슨 킹은 영국, 색소폰 연주자 제이 멧칼프는 미국 출신이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무국적의 집시 음악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첫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지만 집시 퀸즈는 이미 확실한 마니아 층을 지닌 그룹이다. 11년 전 니스에서 결성된 그룹은 세계를 돌며 일년에 2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공연 장소는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주로 오는 고급 레스토랑과 파티. 로드 스튜어트, 엘튼 존, 퀸시 존스, 로버트 드 니로, 브래드 피트, 데이비드 베컴, 영국의 윌리엄과 해리 왕자 등 유명 인사들이 이들의 공연에 환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집시 퀸즈일까?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그룹인데도 말이다. 이들에 앞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집시 킹즈-진짜 집시 혈통의 연주자들로 구성된-가 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다섯 멤버는 특별한 그룹 이름을 지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로마의 한 레스토랑-역시 고급인-에서 공연을 펼치던 중 레스토랑 주인이 이들이 집시 킹즈와 유사하다는 생각에 농담 삼아 ‘나의 집시 퀸즈는 어디 갔을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들은 한 여성이 그들에게 집시 퀸즈를 그룹 이름으로 제안했다. 다섯 연주자들은 주저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아무튼 그룹 이름 때문인지 집시 퀸즈는 종종 집시 킹즈와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집시 킹즈와 집시 퀸즈가 결투라도 할 것처럼 만나 결국엔 함께 노래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로 두 그룹의 사이는 좋은 것 같다. 사실 집시 킹즈가 집시 음악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면 집시 퀸즈는 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집시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팝 적인 양식을 적극 수용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앞에 두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손님의 취향을 반영한 음악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집시 퀸즈의 음악이 무늬만 집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음악에 내재된 정서만큼은 집시적이니 말이다.
이번 첫 앨범은 런던 레이블의 주인 닉 라파엘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다. 2010년 니스의 라 쁘띠 매종(작은 집)이라는 레스토랑에 아내와 함께 온 닉 라파엘이 관객과 호흡을 맞추고 함께 노래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집시 퀸즈의 탁월한 솜씨에 반해 계약을 제안했다고 한다.
집시 퀸즈는 레스토랑과 파티에서 공연할 때 늘 자작곡보다는 잘 알려진 히트 곡들을 노래해왔다. 기본 레퍼토리만 해도 600곡이 된다고 한다. 이번 첫 앨범에서도 이탈리아 칸소네의 스탠더드 곡 ‘L’americano’, ‘L’italiano’, ‘Volare’,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장 자끄 골드만의 ‘Aicha’, 핑크 마티니의 ‘Sympathique’, 스페인의 고전 ‘Malagueña’쿠바의 고전 ‘El Cuarto De Tula’, 그리고 미국의 2인조 그룹 아메리카의 ‘Ventura Highway’, 크로스비 스틸즈 & 내쉬의 ‘Marrakesh Express’, 존 덴버의 ‘Country Roads’ 등 세계 곳곳의 유명 노래들을 선택했다.
세계 곳곳의 노래가 유랑자적인 스타일로 노래되었기에 앨범을 듣다 보면 집시가 되어 세계일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실제 집시 퀸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곡을 고르고 노래한 것 같다. 미국(L’americano, Ventura Highway), 아랍(Aicha), 특히 모로코(Marrakesh), 이탈리아(L’Italiano), 스페인(Malagueña) 등의 지명이 들어간 곡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다. 게다가 앨범이 ‘L’americano’로 시작해서 ‘Country Roads’로 끝나도록 한 것을 보면 그룹이 주요 활동 무대인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앨범을 녹음하게 된 상황을 중심으로 앨범의 서사를 구성한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앨범이 유럽이 아닌 미국 LA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명 제작자 래리 클라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니 미첼을 비롯해 허비 행콕, 마들렌느 페루, 멜로디 가르도, 틸 브뢰너 등의 앨범을 제작한 이 제작자는 연주자나 보컬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집시 퀸즈의 앨범에서도 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제일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첫 곡 ‘L’americao’에서 마들렌느 페루를 참여시킨 것이 그렇다. 포크적 감성을 곁들인 재즈를 노래하는 이 여성 보컬은 한 때 프랑스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그 당시 거리 공연을 하며 음악적 실렸을 키웠었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 그녀의 스모키 보이스는 디디에 카스나티와 조화를 이루며 곡의 매력을 강화한다.
한편 집시 퀸즈가 유럽의 인기 곡 외에 아메리카, 크로스비 스틸즈 & 내쉬, 존 덴버 등의 포크와 컨트리 곡을 노래하게 된 것도 래리 클라인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게다가 ‘Ventura Highway’에서 원곡을 노래했던 아메리카의 두 멤버 게리 베클리와 듀이 버넬을 게스트로 등장시킨 것은 감동이었다. 아마도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사이 팝을 들었던 감상자들은 이들의 등장에 아련한 향수, 마치 고향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을 받을 지도 모르겠다.‘Marrakesh Express’에서 곡의 주인인 그래함 내쉬가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 게다가 디디에 카스나티 외에 제이 멧칼프가 색소폰을 내려놓고 그래함 내쉬와 함께 노래하면서 크로스비 스틸스 & 내쉬의 환영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 외에도 앨범에는 1970년대의 소울 밴드 부커스 T & 더 엠지스의 오르간 연주자였던 부커스 T 존스, 명 세션 기타 연주자 딘 파크 등이 참여해 집시 퀸즈와 호흡을 맞추었다.
제작자 래리 클라인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앨범에서 집시 퀸즈가 단순히 제작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래리 클라인은 어디까지나 집시 퀸즈의 매력을 돋보이는데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것은 제작자가 원곡의 보컬들을 참여시키면서까지 대중적인 맛을 더 강화하려 했음에도 그 사운드는 여전히 집시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언급했듯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유럽과 미국을 그리고 있음에도 집시 퀸즈는 원곡의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결국엔 이 곡들을 유랑 길에 오르게 한다. 이곳 저곳을 방랑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 그곳의 정서를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다시 떠날 수 밖에 없는 집시의 숙명을 곡 안에 부여한다. 그리고 이 집시의 숙명은 집시 퀸즈의 숙명이기도 하다. 각기 다른 국가 출신의 연주자들이 모여 세계를 돌며 여러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들이 비록 집시는 아닐 지라도 그 삶은 집시 같지 않은가?
매일 단조로운 일과를 반복하다 보면 깃털처럼 가볍고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이곳 저곳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있지만 우리의 몸은 늘 이 자리에 있다. 무작정 떠나는 해방의 느낌 뒤로 막연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스믈스믈 기어 나오기 때문이다. 한 발작 앞으로 내딛기 전에 우리는 고향, 근원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먼저 느낀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용기 없음에 좌절하는 것이다. 그럴 땐 이 앨범을 들어보자. 떠나지 못한 아쉬움을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가방을 들고 일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