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즈의 별을 빛나게 했던 연주자
유명 연주자들의 내한 공연 기사가 아니면 그다지 해외 재즈 기사를 싣지 않는 국내 신문들이 지난달 앞다투어 피아노 연주자 행크 존스가 5월 16일 뉴욕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다. 몇몇 신문은 단순 부고기사를 넘어 그의 삶을 간략히 조명하는 기사까지 냈다. 따라서 신문의 문화면을 챙기는 독자들이라면 그의 사망 소식을 읽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를 모르는 독자는 차치하고 그를 아는 재즈 애호가들 상당수는 세상을 떠났다지만 그가 정말 재즈계에 중요한 인물이었나 의문을 가질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평온하고 평범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평범했기에 특별했다.
루이 암스트롱, 엘라 핏제랄드,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빌 에반스……재즈 역사를 빛낸 연주자들 대부분은 스타일리스트였다.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누구도 넘보기 힘들었던, 그래서 후대 연주자들이 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그만의 독특한 무엇을 말한다. 들으면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연주 혹은 노래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일종의 서명 같은 것이다. 이 스타일은 연주 방식, 창법은 물론 악기나 목소리의 미묘한 질감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행크 존스는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1급이긴 했지만 재즈 피아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쪽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평범하다 싶을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자리를 지킨 경우였다.
따라서 행크 존스는 재즈라는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은 아니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그의 움직임이 세상사람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인기를 크게 누려본 적도 없다. 오히려 그는 별을 감싸는 하늘의 어둠과도 같았다. 별의 반짝거림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어둠 말이다. 실제 그는 스스로 돋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다른 연주자들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나아가 자신을 뒤로 감추고 그들을 반주하는 역할을 즐겼다. 그래서 그의 주요 활동가운데 상당수는 사이드 맨이나 반주자로서 다른 연주자나 보컬의 앨범에 참여한 것이 차지한다.
그는 1918년 7월 31일, 미국 미시시피주의 빅스버그에서 태어났다. 그는 칠 형제의 장남이었는데 그 가운데 태드 존스와 엘빈 존스, 두 동생은 그처럼 평생 재즈 연주자로 살았다. 아무튼 그는 일찍이 피아노를 배우고 13세부터 지역 밴드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테디 윌슨, 얼 하인즈 같은 선배 연주자의 영향을 받은 연주를 즐겼는데 1944년 색소폰 연주자 럭키 톰슨의 초청으로 뉴욕에 가게 되면서 당시 시대를 휩쓸고 있었던 비밥을 몸으로 체득했다. 그리고 콜맨 호킨스, 빌리 엑스타인 등과 함께 하다가 후에 버브 레이블을 설립하게 되는 제작자 노먼 그란츠가 운영하고 있던 Jazz At The Philharmonic 밴드의 피아노 연주자로 순회공연을 시작했고 1948년부터는 약 5년간 엘라 핏제랄드의 반주자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 사이 찰리 파커의 앨범에 사이드 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레스터 영, 캐논볼 아들레이, 폴 체임버스, 존 콜트레인, 웨스 몽고메리 등 스타 연주자들과 협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예 그는 비밥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사보이 레이블의 하우스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1959년부터 1975년까지는 CBS 방송국 오케스트라의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에드 설리번 쇼에서 프랑크 시나트라 등의 반주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1962년 5월 19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 시대의 섹스 심볼이었던 마릴린 몬로가 특유의 뇌쇄적인 목소리로 생일 축하곡을 노래했을 때 반주를 했던 사람도 그였다.
이처럼 그는 많은 연주자 혹은 보컬이 찾는 연주자였다. 재즈 사를 빛낸 주요 연주자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은 연주자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더 답하기 쉬울 정도로 그가 함께한 연주자들은 수를 셀 수 없다. 많은 연주자나 보컬이 그를 찾은 이유는 그의 연주가 언제나 적절한 여유와 여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동료와의 대화를 즐겼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것은 그가 리더로 활동한 트리오 연주를 들으면 알 수 있다. 1975년부터 그는 행크 존스 트리오가 아닌 ‘The Great Jazz Trio’라는 이름으로 트리오를 이끌었다. 그런데 자신이 리더임에도 그는 절대 피아노로 전체를 압도하려 하지 않았다. 함께 하는 베이스와 드럼이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세 연주자의 합을 넘어서는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도록 이끌었다. 트리오가 론 카터, 리차드 데이비스, 조지 므라즈, 존 패티투치 등의 베이스 연주자들과 토니 윌리엄스, 알 포스터, 엘빈 존스, 잭 드조넷 등의 드럼 연주자들로 멤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30년 이상을 한결 같은 사운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나 겸손한 연주를 펼쳤기 때문일까? 생각보다 그는 재즈의 메이저급 레이블에서 앨범을 많이 녹음하지 못했다. 60여장의 많은 앨범-사실 그가 60년 이상을 활동한 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가운데 상당수를 군소 레이블에서 녹음했으며 솔로 연주자로서는 일본에서 더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므로 앨범만을 두고 본다면 밴드의 리더, 솔로 연주자로서의 그의 삶은 그리 화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만큼 살아서 연주자들의 존경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재즈의 변화를 온 몸으로 경험했으며 그 와중에서도 재즈의 기본을 보존하고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재즈는 언제나 자기 부정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난 100여 년간 재즈는 다양화와 세분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며 대중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예술적 음악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매번 새로운 흐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 흐름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두텁게 하는 많은 연주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행크 존스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윙 시대를 거쳐 비밥을 체득한 이후 재즈가 수많은 변화를 겪을 때마다 재즈가 과거를 잊고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보존하고 지속시키는 활동을 펼쳤다. 이것은 분명 그리 화려하게 돋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처럼 60년 이상을 한결 같아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보상은 말년에 이루어졌다. 2003년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ASCAP)가 그에게 ‘살아있는 재즈의 전설상’을 수여했으며 2009년 그래미상 위원회는 그에게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렇게 90세가 넘어서야 그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다. 그의 명복을 빈다.
대표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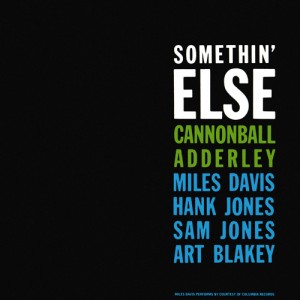 Somethin’ Else – Cannonball Adderley (Blue Note 1958)
Somethin’ Else – Cannonball Adderley (Blue Note 1958)
지난 2008년 그의 90세 생일을 맞아 미국의 잡지 빌리지 보이스와의 인터뷰 중에서 평생에 걸쳐 기억나는 녹음으로 행크 존스는 뜻밖에도 이 앨범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재즈사의 명반 가운데 명반인 이 앨범에서 행크 존스의 피아노는 하드 밥의 열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Autumn Leaves’같은 곡에서는 특유의 감칠맛 나는 연주를 펼친다.
 Someday My Prince Will Come – The Great Jazz Trio (Village 2003)
Someday My Prince Will Come – The Great Jazz Trio (Village 2003)
행크 존스의 피아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reat Jazz Trio의 앨범을 듣는 것이 좋다. 본인은 트리오의 첫 앨범 <At The Village Vanguard>를 지목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앨범은 구하기 어려운 편. 그래서 동생 엘빈 존스와의 마지막 만남을 담고 있는 트리오의 후기작을 추천한다. 행크 존스가 추구한 조화로운 트리오 연주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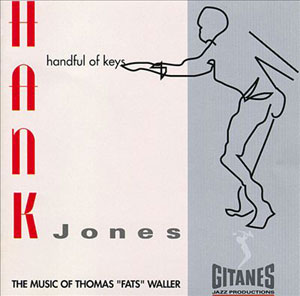 A Handful of Keys: The Music of Thomas “Fats” Waller (Verve 1993)
A Handful of Keys: The Music of Thomas “Fats” Waller (Verve 1993)
재즈 피아노 연주자로서 그는 초기에 패츠 왈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앨범에서 행크 존스는 패츠 왈러를 추억하며 패츠 왈러가 만들었거나 즐겨 연주한 곡들을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 연주했다. 하지만 꼭 패츠 왈러 스타일로 연주하는 대신 평생에 걸쳐 이룩한 그만의 부드럽고 여유로운 연주로 패츠 왈러를 낙관적인 정서로 새로이 드러낸다.



